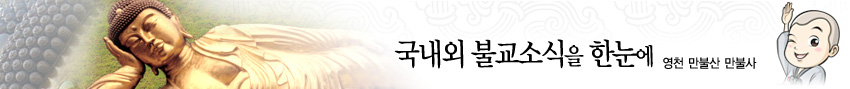|
미황사는 이 땅 남쪽의 맨 끄트머리에 자리잡은 사찰이다. 서울에서 이른 아침밥을 먹고 출발해도 저녁 때 맞춰 그곳에 도착하긴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그곳은 오래된 역사와 더불어 달마산을 뒤에 두고 앞으로 남해가 보이는 풍광을 가지고 있다. 여느 천년 고찰의 아름다움에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황사는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폐사에 가까운, 퇴락한 ‘옛절’이었다.
하지만 그 궁벽한 산골 절을 찾는 사람이 이제 1년에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 미황사에 머물며 템플스테이 하고 싶다고 발길을 두는 사람도 매해 5천 명을 넘어선다. 이 궁벽한 산골의 작은 절은 어떻게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됐을까? 그 중심에는 2000년부터 미황사 주지로 살고 있는 금강 스님이 있다.
금강 스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장점을 발견해내는 역발상을 통해 세상과 호흡한다. 마을 주민을 주인공으로 세워 산사음악회를 열고 세상 누가 찾아오든 마음 편히 스님과 차 한 잔 할 수 있도록 사찰 문을 활짝 열었다. 사람들은 세상과 호흡하고 자신의 고민을 받아주는 미황사, 그리고 금강 스님에 열광한다.
이 책 속에 있는 금강 스님의 글들에는 이렇게 사람들과 호흡하는 미황사의 사계와 24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따뜻한 것을 애타게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한겨울의 온돌방을 생각하게 하는 따스함이 있는 글들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장점을 발견해낸 금강 스님의 역발상
“2000년 봄이었다. 백양사 운문암에서 동안거 해제를 하고 미황사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고 난 아침이었다. 아랫마을 사는 노보살님이 밥을 해주러 올라와서는 “오메 시님 오셨소! 그나저나 스님 축하하요.” 한다. “축하는 무슨 축하요?” 궁금해서 물으니, 주지 현공 스님이 어제 떠나면서 “‘인자 금강 스님 보고 주지 스님이라 하시오’ 했당께요.” 하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아득해졌다.
지난 겨울 선방에서 유달리 공부가 잘 되어 ‘이왕 시작한 공부 뿌리를 뽑으리라’ 마음먹은 참이었다. 내친 김에 옷가지 몇 개 챙겨 떠나려고 들른 길인데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다. 그때부터 망연히 세심당(洗心堂) 차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 본문 95쪽 ‘자, 차나 한 잔 하십시다’ 중
금강 스님은 그렇게 미황사의 주지가 됐다. 이판(수행승)의 길을 가고자 했으나 사판(포교와 행정을 담당하는 승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그의 글에는 늘상 묻어 있다. 더군다나 금강 스님이 주지로 부임할 당시만 해도 미황사는 궁벽한 산골의 폐사나 다름없던 쇠락한 절이었다. 그곳에 서면 뒤에는 아름다운 달마산이 그리고 눈앞에는 시원한 남해가 한눈에 펼쳐지지만 … 대웅전 한 칸과 응진전만이 그 절의 유일한 전각이던,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았던 ‘작은 절’이었다. 하지만 전 주지 현공 스님이 불사(佛事, 절을 짓고 보수하는 일)를 맡고 금강 스님이 포교와 행정을 담당하면서 미황사는 일신했다.
이제 해마다 미황사를 찾는 사람은 10만 명을 웃돈다. 미황사의 연간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2009년을 기준으로 5000명을 넘는다. 백양사(3002명), 화엄사(2056명), 대흥사(2393명), 송광사(2114명) 등 전라도 지역 어느 사찰도 채우지 못한 기록적인 숫자다. 그리고 가을의 산사음악회와 괘불재에는 그곳이 궁벽한 산골의 작은 절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 이상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 여름에 열리는 어린이 한문학당은 신청자가 많아 돌려보내야 할 정도다.
마을주민이 주인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반가운 손님인 곳
“마을에서 그냥 소리하는 사람인디 미황사 금강 스님이 소리가 하도 좋다고 항께 여기까정 나와 부렀소. 소리 한 대목 하고 내려 갈라요.”
정기열 할아버지는 미황사가 있는 땅끝마을 사람이다. 미황사 산사음악회 첫 회부터 빠지지 않고 무대에 올랐다. 귀동냥으로 배운 가락을 미황사 산사음악회에서 뽐내고 나서부터는 점점 소리가 좋아지더니 어느새 해남 판소리의 대표주자가 됐다. 팬클럽이 만들어질 정도다.
광수전자 박광수 사장님은 땅끝마을 읍내에서 오랫동안 전파사를 하는 미황사의 신도였다. 미황사 산사음악회를 돕다가 장비를 늘리다 보니 이제 실력까지 일취월장했다. 이제 땅끝마을의 지역 축제 음향을 전담할 정도다.
미황사는 이처럼 모든 행사에 지역민들을 주인공으로 세웠다.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이 행사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골몰했다. 누구나 이것이 성공요인이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매년 열리는 괘불재에 선보이는 만물공양시간에 올려진 공양물을 보면 이를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자기가 농사지은 쌀이나 과일은 물론이요 자신이 정리한 노트나 발명특허 등을 올린다. 1년 동안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과물을 올리고 함께 나누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미황사의 모든 행사가 그렇듯 참가자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직 불교의식이나 의례로만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세상 모두가 주인인 행사로 바꿨다.
또 마을 아래 학생 수 다섯 명으로 폐교 위기를 맞았던 학교를 60명으로 만든 이야기나 마을의 당제를 지내기 위해 길을 나서는 스님의 모습에는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과 부딪치기 위한 고민이 깊게 배어 있다.
“나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 위안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
“문득 20여 년 전 일이 생각난다. 무주에 살 때인데 광주에 나왔다가 막차를 놓치고 갈 곳이 없어 광주공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었다. 여름이라 공원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의자에 앉았으니 한 사람씩 다가와 자기 삶의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더니 고맙다며 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인데 마치 해결책이라도 가르쳐준 냥 고마워했다. 그때 그들을 보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무얼 어떻게 채워야 할지 크게 발심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듯 수행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 본문 136쪽 ‘사람을 만나며 나를 만나는 길’ 중
스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그들에게 해준 것이라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차 한 잔을 대접한 것뿐’이라고 한다. 어쩌면 이것이 수행하는 자가 세상을 소통하는 법일 수도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사찰은, 그리고 종교는 세상과 어떤 형태와 방법을 통해 소통할 것인지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일러주는 것 같다.
불광출판사 / 12,000원
* 이 기사는 '불광출판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