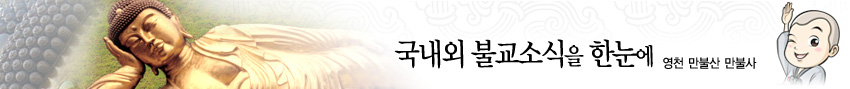|
절, 인문(人文)이라는 부대에 옮겨 담다
일주문에서 해우소까지. 절에 가면 수많은 전각과 조형물을 만나게 된다. 절의 평화롭고 고요한 풍광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르고, 사진을 찍고, 또 어떤 이는 글을 써 책으로 묶기도 한다. 이렇듯 천년고찰의 고즈넉하고 한가로운 풍경은 누구에게나 동경의 대상이다.
하지만 길 위에서 만난 절, 그 속의 삶은 바르고 올곧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절이 먹은 나이에 걸맞게 그곳은 수많은 굴곡, 사실 아닌 전설과 믿기 힘든 역사가 있다. 또 민초들은 이를 믿으며 지탱해 왔다. 저자는 이런 절들의 속살을 살핀다. 찬탄 뒤에 숨어 있는 한숨을 들춰내고, 영광 뒤에 자리잡은 좌절의 또아리를 짚어낸다.
사람들은 갑사에 가면 오르는 길에 펼쳐진 아름다운 계곡과 천년이 넘게 외롭게 서 있는 당간지주 그리고 고즈넉한 대웅전에 흠뻑 빠지곤 하지만 저자는 갑사 목판에 새겨진 불족적(부처님의 발)을 본다. 그곳에서 “가장 성스러운 만큼 가장 더러웠으리라 짐작되는” 발에 대해 명상하며 급기야 “발 냄새만 한 수행의 향기가 어디에 있겠는가.”고 반문한다.
호랑이의 기세를 누르기 위해 세워진 서울 호압사를 찾아서는 “밤길에 등 뒤를 노리던 야수(호랑이)의 위세는 오늘날 치한과 퍽치기, 음주운전차량 등이 대체했다.”며 “역사가 반독되듯 호랑이도 재림하는 셈”임을 살핀다.
이처럼 저자는 사찰의 밖에 드러난 전각이나 탑 등의 모습이 아니라 절 속의 풍물과 역사에 주목한다. 그래서 때론 낯설기도 하지만 수없이 쏟아지는 사찰 기행기와는 그 심급이 확연히 다르다.
이런 시선이 때론 불경스럽기도 하지만 저자는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원칙”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부처님을 봐야 할 경우도 있다.”며 “그래야만 중생을 부처님 눈 닿는 곳에라도 붙들어 놓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을 읽다보면 저자는 뭇이들처럼 사찰의 풍광에 대한 예술이나 종교적 접근이 아닌 인문적 접근을 감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절이라는 텍스트(구조물)가 아니라 절을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풍광과 역사)를 찾아 떠난 여행 이야기다.
마흔두 곳 사찰,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이야기
이 책에 등장하는 사찰은 모두 마흔두 곳. 소재로 삼고 있는 이야기 역시 마흔두 가지다. 공주 영평사의 구절초, 강진 백련사의 동백, 천안 광덕사의 호두나무 등 절 안팎에 흐드러진 풀과 나무에서부터 의정부 망월사의 위안스카이, 괴산 공림사의 송시열, 상주 남장사의 이백 등 역사 인물까지. 그리고 급기야 안성 칠장사에서는 반란을 꿈꾸었던 민중들의 ‘지도자’ 임꺽정의 일들과 제주 서관음사에서는 4.3을 기억해 내기도 한다.
저자가 꺼내든 마흔두 가지의 소재는 자연을 침범하는 인간에 대해 때론 물신화된 절 안팎의 모습에 대해 그리고 때론 생명과 깨달음을 안은 구도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등장시킨 조연들이다.
물론 이런 모습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저자는 <불교신문> 기자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찰을 답사하고 또 종교(불교)의 안팎을 오랫동안 살펴왔다. 때문에 좀 더 내밀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혜안(慧眼)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절에서도 그 절 안의 ‘깨달음’, ‘생명’, ‘역사’,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저자가 이런 작업을 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연을 알아주면 절들은 대번에 반색을 하고 아예 곳간까지 내주었”고, “그들이 허락한 자리엔 이런저런 깨달음이 쌓여 있었”고 또 “그것들을 쏙쏙 빼먹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즐거웠다고 고백한다.
이제는 수없이 늘어만 가는 사찰 기행이나 답사기와는 다른 글을 나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자의 글은 더욱 독특하고 또 유의미한 작업이었다. 불교와 사찰을 소재로 한 많은 글들이 있지만 쉬이 만날 수 없는 소중한 글들이다.
<불광출판사 펴냄 / 272쪽 / 1만 3000원>
|